
영어라는 낯선 이름과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ESL 반에 들어갔다.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말 그대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이들이 들어가는 반이었다. 선생님은 영어로만 수업을 했고, 나는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그나마 몇 단어 정도만 들렸고, 그걸 바탕으로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려 했다. 그렇게 시작된 영어 수업은 어렵고 답답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듣고 맞추는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 영어가 조금씩 익숙해졌다. 단어 하나하나보다는 상황을 통해 의미를 추측하는 방식이 내게 잘 맞았다. 오히려 그 덕분에 영어 실력은 빠르게 늘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아직 초등학생인 우리를 위해 원어민 선생님들은 사탕 같은 군것질 거리를 상으로 주셨다. 당시에 나는 "monday", "candy", "give" 딱 이 3 단어를 알아들었고, 선생님이 월요일에 사탕을 주시겠다는 맥락을 이해하였다. 실제로도 월요일에 내가 그 사탕의 주인공이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영어라는 언어가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올바른 공부방식을 선택했던것 같다.
영어로 살아야 했던 학교
우리 학교에는 Demerit 제도가 있었다. 특히 영어 수업 중에 한국어를 쓰면 벌점을 받는 규칙이 있었다. 하루 여덟 시간 수업 중 다섯 시간이 영어 수업이었다. 결국 나는 거의 하루 종일 영어로 말하며 지내야 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선생님께 질문을 할 때도 영어로 해야 했다. 한국어가 입에 맴돌아도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수가 줄었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부담스러웠지만, 영어를 익히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나중에는 일상적인 대화는 대부분 영어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다. 집에서는 형과도 영어로 대화하기도 했다. 반은 장난이었지만, 지금도 가끔 영어로 대화하기도 한다. 물론 지금은 영어를 까먹지 않기 위해 하지만.
회화는 익숙했지만, 문법은 어려웠다
5학년이 되자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데 어려움은 거의 없었다. 일상 대화, 수업 참여, 간단한 발표 정도는 문제없이 했다. 하지만 문법 수업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졌다. 과거형, 복수형, 시제 같은 문법 규칙은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말은 되는데, 글을 쓸 때면 자주 틀렸다. 그래도 그 시절은 내 영어 실력의 기초를 다진 시기였고, 처음으로 외국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몸으로 배웠다.
물론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 시간과는 달랐을 것이다. 영어로 수업을 받는 시간이 총 5교시였는데, 문법, 회화, 문학, 사회과학, 과학으로 나눠져 있었다. 다 영어로 배우기 쉬운 과목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영문법이 제일 어려웠다고 자신한다. 중간, 기말 시험 문제만 각 200문제에, 수업도 마치 SAT(미국 수능)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방식을 채용하여 학창 시절 내내 나의 성적을 끌어내린 주범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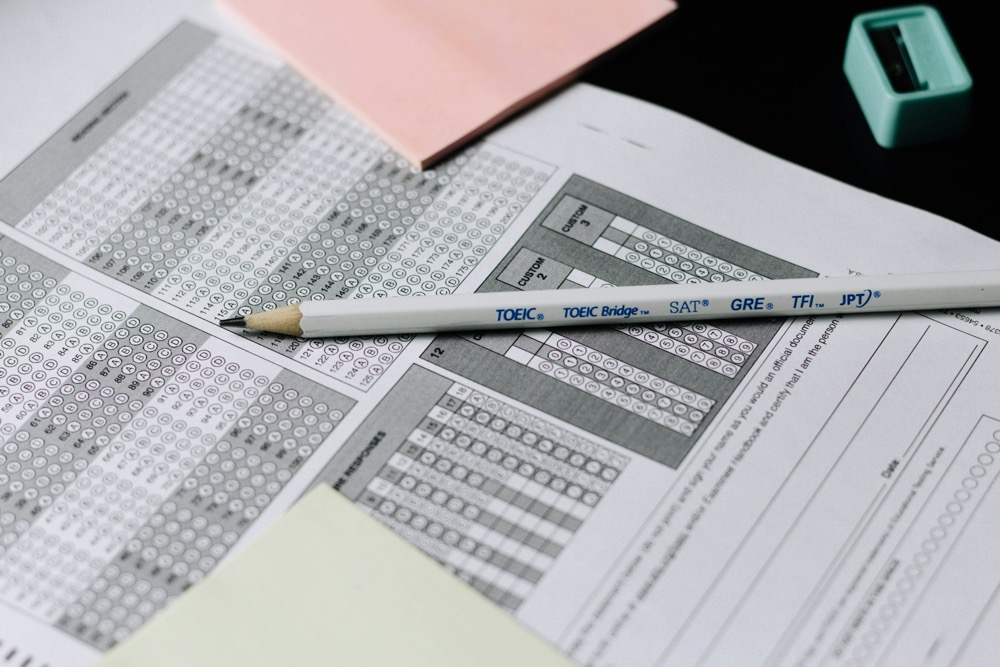
SAT, 실제로 풀어보니...
국제학교다 보니 대입 준비를 빠르면 고1에서 늦어도 고2때는 시작을 해야 했다. 한국으로 대학을 오려고 해도 수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고3 1학기는 원서 넣고 시험 보기 바쁘니까. 그리고 여름방학 때면 결과가 나왔다. 학교에서는 토익반, 토플반, SAT반 등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내가 있을 때는 애초에 교과목 시험들의 유형을 비슷하게 내서 토익이나 SAT에 익숙하게 해 주셨는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SAT는 한국 수능과 달리 마치 토익처럼 시험을 여러번 볼 수 있었다. 다만 시험비는 회당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볼 엄두는 나지 않았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수 밖에는 없었다. SAT는 크게 수학과 영어로 나뉘는데, 수학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었고, 다만 지문이 영어로 길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 독해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영어는 굉장히 어려웠다. 영어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으나, 중간에 Dummy, 즉 점수에 영향이 없는 챕터도 존재해서 체력도 요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점은 그렇게 어려운 레벨의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한국에서 대학교 입학 영어 시험이나 토익은 굉장히 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덕분에 내 대학생활 동안 영어로 고생한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영어는 생존에 필수였다
결국 나는 살기 위해 계속해서 영어공부를 했고, 그것이 내 영어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학교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친구들과 경쟁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에서처럼 치열한 경쟁은 아니었다. 외국에 살다보니 생존에 직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노력한 것은 그저 개인의 향상심 때문이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복받은 환경에서 지내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닫고 살았다. 내가 경쟁한 대상이 내 친구들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